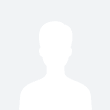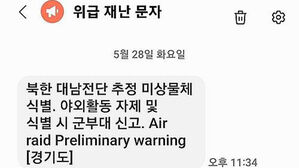박배일 영화감독이 영화 ‘밀양아리랑’을 촬영하고 있다. 본인 제공
2014년 6월 10일, 영순 할매께 체크무늬 셔츠를 빌려 입은 나는 경찰 눈을 피해 115번 송전탑이 세워질 현장으로 갔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위로 자재를 실어 나르는 헬기에 대고 영자 할매가 소리를 지른다. 한쪽에선 사람들이 모여 경찰이 진입할 예상 경로를 파악해 대책 회의 중이다. 천막 아래 파놓은 구덩이 ‘극락전’에선 할매들이 쇠줄을 목에 묶고 서로의 모습을 보며 낄낄댄다. “박감독, 목걸이 어떻노? 이쁘나?” 전처럼 농을 받아 칠 수 없어 짜증내며 극락전을 빠져나왔다. 천막 뒤에 앉아 심호흡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흘렀다.
‘할매는 몸으로 싸우고, 박감독은 기록해서 알린다!’ 2012년 봄, 밀양에 연대했을 초기 각자 역할에 관해 우리가 한 약속이다. 기록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해 여름 할매들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저항한 날의 기록을 보며 약속을 어긴 영화 활동가의 모습을 발견했다. 카메라는 땅과 하늘을 오가며 흔들렸고 걸걸한 내 목소리는 누구보다 크게 경찰을 향해 욕하고 있었다. 할매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지만, 카메라를 쥔 나는…. 이후 내 목소리는 뷰파인더에 담긴 장면이라고 되뇌며 녹화 버튼을 누른 뒤에는 눈앞의 현장과 거리를 두고 침묵을 유지하려 애썼다.
2014년 6월 11일, 어두운 산을 뚫고 온 연대자로 들어찬 천막은 새벽 차가운 공기와 달리 훈훈했다. 천막에 들어오지 못한 연대자는 잔가지를 주워 피운 모닥불에 모여 컵라면을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딱히 몸이 떨리지 않았는데 손바닥을 비벼 빈 세수를 하고 손과 발 털어내기를 반복했다. 경찰의 군홧발 소리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신부님과 수녀님이 미사를 시작했다. 후드득, 커터 칼에 찢긴 천막은 삽시간에 뜯겨 나갔고 철제봉 사이로 경찰이 몰려 들어왔다. 극락전에 있던 할매들은 곡을 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이후 극락전에서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천막과 극락전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철거됐고, 웅덩이로 변한 극락전 자리를 멍하게 바라보던 영자 할매가 같이 죽자며 웅덩이로 달려갔고, 연대자들은 영자 할매를 말리기 위해 우왕좌왕했고, 포크레인은 밭에 있는 나무를 꺾으며 공사할 길을 만들었고, 115번 현장 진압 임무를 마친 경찰과 밀양 공무원은 다음 현장인 126번 현장으로 향했고, 모든 현장을 진압한 경찰은 승리의 V자를 그리며 기념사진을 찍었고, 그때부터 내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하는 사람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극락전에 가장 늦게 내려갔고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 그리고 극락전에서 끌려 나오는 할매들을 ‘잘’ 찍기 위한 자리를 찾아 헤맸고 편집 지점을 생각하며 화면 크기를 나눠 촬영했다. 영자 할매가 웅덩이로 달려가는 걸 겨우 말린 연대자와 영자 할매가 부둥켜안고 울고 있을 때, 많은 카메라가 그 모습을 찍기 위해 달려갔지만, 나를 제외한 모든 카메라가 연대자에 의해 촬영을 제지당했다. 현장을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는 감각과 영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내 모습, 그리고 연대자와 주민의 신뢰에 대한 뿌듯함. 내게 2014년 6월 11일은 지옥 같던 기억과 영화 활동가로서 원칙을 저버리고 인간 되기마저 포기한 나의 악랄함으로 새겨져 있다. 그래서 나는 그날의 공기, 촉감, 긴장, 분노, 부끄러움으로 뭉쳐진 기억을 도려내고 싶다. 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봄처럼 6월 11일은 어김없이 되돌아왔고 그날을 잊고 싶은 나의 바람과 달리 6월 11일을 함께 겪은 우리는 그날을 증언하고 기록하고 기억하자고 외친다. 그렇게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날을 살아내고 있다.
나는 작년 2월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다. 공부를 핑계로 왔지만, 한국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 이곳에서 가끔 우연한 마주침을 기록하고 있다. 꽃, 나무, 땅, 바다, 고양이, 보물찾기하는 아이, 길거리 공연, 벽에 그려진 낙서와 그림,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 함께 먹는 밥… 등. 어쩌면 밀양에서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이런 장면을 찍을 때마다 밀양 할매께 말을 건넨다.
“할매 잘 지내고 있어예? 저는….”
밀양 행정 대집행으로 주민 농성장이 철거된 지 10년이 지났다. 두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지만 송전탑은 예정대로 설치됐다. 마을 어디에서도 보이는 100m 높이의 송전탑은 지금도 소음과 빛을 내뿜고 있다.아직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행정 대집행 10주년을 맞아 송전탑 옆에 서서 기후위기, 핵발전, 국가폭력에 맞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5회에 걸쳐 게재한다.

밀양, 아직 싸우고 있다[밀양 행정대집행 10년]
산으로 둘러싸인 밀양은 어둠이 일찍 찾아왔다. 765kV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인 산 아래에 세워진 농성장에는 할머니 두어분이 계셨다. 늦은 밤 촛불 하나 켜고 이야기를 나누는...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